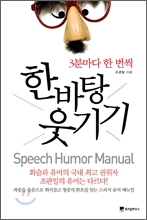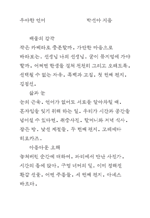
우아한 언어
- 저자
- 박선아
-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 출판일
- 2023-07-21
- 등록일
- 2024-01-19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4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내 마음과 크기가 딱 맞는
어느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에디터이자 콘텐츠디렉터로 활약하다가 이제는 아트디렉터로서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박선아 저자. 그사이 직업의 명칭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아름다움을 탐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간 저자가 펴낸 『어떤 이름에게』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 등의 에세이가 일상의 장면이나 대상에게서 발견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번 신작 『우아한 언어』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감각과 시선 그 자체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내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홀로 무척이나 외로웠던 시절,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감정을 사진이나 음악, 문학, 영화 같은 것들이 이해해주는 게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내 마음과 크기가 딱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에 시선을 빼앗기고, 자연스레 미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업도 찾아들었다. 대학 도서관 예술과학자료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집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은 돈을 모아 사들였다. 본격적으로 미학을 공부하고 싶어 유학을 준비하다가 사정이 생겨 도중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예술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미학’이라는 단어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미학이란 “자연 및 인생에 있어서의 미적 현상 내지 예술 현상에 대한 경탄(marvel)과 경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아름다움을 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의 근육이 있다
발레를 하는 데 근육이 필요하듯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데에도 ‘눈의 근육’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근육처럼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 막막하거나 답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진집이나 전시를 통해 “깊이 예술을 탐구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마련한 구조” 안에서 좋아하는 사진가들의 작품을 자주 마주하고, 사진에 대한 수업을 찾아 듣고 부지런히 사진이나 예술에 관한 책을 찾아 읽는 저자의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듯, “본 것이 쌓인 만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책은 그래서 한생을 걸쳐 천천히 오래도록 이어지는 ‘배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대학 시절, 지금은 ‘안목’이라는 사진 갤러리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태희 선생의 ‘사진 미학’ 수업을 듣고 그와 대화를 나누며 익힌 지혜, 필름 현상 수업을 찾아 들으며 배운 것과 뮤지엄에서 거장의 작품을 마주하며 감각한 인상, 사진가나 동료들과의 진지하면서도 치열한 대화, 흠모하는 예술가들에게 쓴 편지 등 저자의 배움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관점이 날카롭게 벼려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모호하고 과묵한,
우아한 언어를 취미로 갖는 일
저자의 오랜 취미였던 사진은 어느새 글 이외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로 자리한다. 저자는 누군가 쓰고 싶은 글에 대해 물으면 사진처럼 기억에 남는 글을 쓰고 싶다고 답한다며 다음처럼 말한다. “글자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글로 남기다 보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다. 쓰는 자신이 밉고 싫을 때, 내게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정지시킨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이 폴더 안에 쌓이듯, 보았던 어느 장면들이 설명 없이 쌓여가는 일이 다행스럽다. 이 모호하고, 과묵한 언어를 취미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호하고 과묵한 언어인 사진에 ‘우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본다. 인화지 박스를 보며 ‘우아한 도구’, 약품에 뭔가를 넣고 흔드는 ‘우아한 방식’, 암실의 빨간 시계의 초가 지나는 걸 보며 ‘우아한 시간’. 사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다루는 장비, 해석하는 태도 같은 것들 모두 우아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도 각자의 ‘우아한 언어’를 찾아보라고 권한다. 말과 글이 가진 정확하고 또렷한 힘이 어쩐지 버거운 날, 그런 날에는 조심스레 한구석에 숨겨둔 우아한 언어를 꺼내볼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