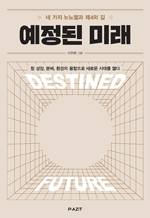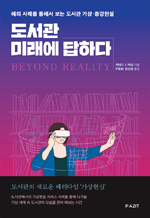건강의 비용 - 다가올 의료 대혁신에 대비하는 통찰
- 저자
- 김재홍
- 출판사
- 파지트
- 출판일
- 2023-05-24
- 등록일
- 2023-11-15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251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의료 영역은 서비스라는 말을 담기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 분야가 광범위하지만, 의료의 본질은 생명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듯, 건강은 여전히 제일이다. 인류는 여전히 질병과 다투고 있고 서로의 영역을 뺏고 빼앗아 가며 나름의 고귀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인류의 생존 최전선에 있는 영역은 어쩌면 신성한 영역이 아닐까. 우리가 의료를 신성시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선생님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제외하고 우리는 언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까? 습관처럼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렇게 쉽게 쓰진 않는다. 내가 뭔가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저 사람의 심기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손익이 있을 때 보통 조심스럽게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 아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아래에 두는 호칭. 옛날 같으면 “대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게 바로 의사선생님이다. 다른 말로 치환이 불가능한 대명사다. 병원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전자기기를 살 때는 가성비, 가심비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본다. 비슷한 성능의 제품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예산에 맞춰서 제품을 결정한다. 제품 선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지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심지어 의학용어도 모른다. 여담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종이차트에 적힌 처방을 받던 시절에는 이게 무슨 글씨인지 과연 간호사들은 이 글씨를 알아보는 것인지 궁금하곤 했다. 병원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생명과 연관성이 깊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다. 생명은 전자제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 영구적인 손상 또는 죽음과 가깝다고 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의 우리의 주도성은 사라진다. 이 책의 시작은 이곳에 있다. 서비스의 영역인 의료에서 환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투명성, 고객 중심 프로세스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첫 만남에 저자는 해외에서도 비주류의 이야기라고 했다. 환자 중심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개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병원의 수입 과도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칫 본인도 주변에서 좋은 이야길 못 들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도 사명감으로 쓴 책이라고 했다.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기에는 작은 움직임이겠지만 이 책이 필요한 곳에 닿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