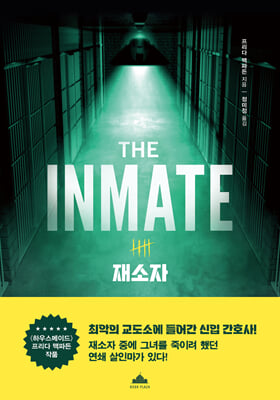굿바이 안네
- 저자
- 베르테 메이에르 저
- 출판사
- 이덴슬리벨(EAT&SLEEPWELL)
- 출판일
- 2012-04-30
- 등록일
- 2013-02-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집단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저자가 전쟁의 상흔을 가진 채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전의 책들이 그 사건에 집중한 데 반해 이 책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가 생긴 이래 최고로 잔인한 만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세기 중반부터 수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다. 이 책 역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녀의 회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형식적으로도 이 책은 소설과 회고록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추억과 강제수용소에서의 암울했던 기억, 고아원에서의 생활, 십대가 되어서 겪은 정체성의 혼란 등 전쟁이 끝난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히 적어 내려간다.
저자는 스스로 이 책을 『안네의 일기』 속편이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고통의 상징이랄 수 있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미완의 작품이기에 지금까지도 물론 속편은 없다. 저자는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 구역에서 안네 프랑크와 함께 자라났고, 베르겐 벨젠에서의 암흑 같은 시간도 함께 보냈다. 따라서 그 후 30년 가까이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그녀야말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물론 역사에서 가정법은 의미가 없지만 이 책은 안네가 살아남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며 읽으면 더욱 다양한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전쟁이 불러온 폭력과 억압, 광적인 인종차별주의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전쟁 후의 삶까지도 품으려는 의도로 쓰인 이 책 『굿바이, 안네』을 통해 저자 내면의 혼란을 그대로 기술하며 전쟁의 잔혹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