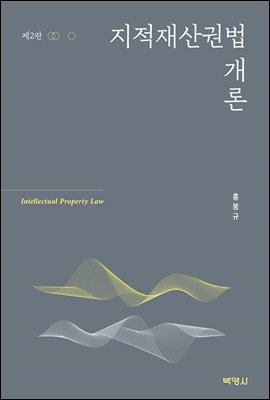과학이론 입문 3
- 저자
- Helmut Seiffert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11-05-01
- 등록일
- 2012-02-1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KB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개별과학분과들의 공통적 기초들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과를 과학이론이라고 한다. 독일어권에서 자이펠트(Helmut Seiffert, 1927~2000)는 스테그뮐러(Wolfgang Stegmuller)와 함께 과학이론의 거장이요 쌍벽이다. 그는 엘랑거 학파의 구성주의적 사고(우리의 사회적 생활세계는 언어, 관습, 법, 윤리, 도덕 등(소위 Sollen 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존재론적 현실과는 다른 ‘현상학적 현실’로서 우리의 창조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사고)의 계승자라는 점에서는 스테그뮐러의 대척자이기도 하다. 스테그뮐러는 일체의 시스템적 순환현상을 악순환(vicious cycle)으로 규정하였던 ‘비인 학단’(Wien’s Circle)을 영미세계에서 대표하였던 카르납(Rudolf Carnap)의 제자이다. 이들은 (현실세계는 신의 창조물로서 유클리드 수학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동일시하는 전통적 존재론적(ontological) 사고를 계승하고 있다. 그 반면, 자이펠트는 흄(David Hume)-칸트(I. Kant)-베버(Max Weber)-스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삐아제(Jean Piaget, 1896~1998)-특히 엘랑거학파?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er School)의 노선에 따라서 ‘사회과학의 방법은 자연과학의 방법과 달라야 한다’고 보는 구성주의적 과학이해(자연과학-사회과학 2원론)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영미권에서 유행적인 포스트-모던적인 구성주의적 조류와도 상통한다. 세상이란 텍스트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분석적 과학관??이 플라톤과 기독교의 창조론의 견해에 따라 과학활동을 모사활동(copying activity) 또는 (예정조화적) 발견이라고 보는 반면, 자연의 세계와는 달리 “문화가치와 결합되어 있는 인간의 생활세계라는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산물로서 비수학적”이라고 보는 ??구성주의적 과학관??은 과학활동을 인간의 계통발생사적 및 개체발생사적 창조활동(creating activity) 또는 발명이라고 본다. 즉, “원숭이들은 원시림 속에서 살지만, 사람들은 문화림 속에서 산다”(Paul Lorenzen)는 은유의 예에서 분석적-현실주의적 과학관이 사회과학에서도 전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구성주의적 과학관은 후자의 입장을 고수한다.
우리나라 사회과학은 압도적으로 전자의 영미권의 분석적 실증주의 전통을 충실히 따랐으며, 유럽대륙국가들의 주류적 과학관인 후자의 과학관은 거의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러나 역자에게는 우선 의식을 지닌 인간이 의식 이전의 ‘존재론적 실재’(ontological reality)를 인식할 수 있느냐’가 의문스럽다. 이 물음에 대한 역자의 대답은 “No”이다. 첫째, 존재론적 현실과 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보는 소위 ‘진리상응이론’(corresponce theory of truth)도 이에 좌우되는데, 여하튼 ‘인간은 현상학적 현실만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구성주의자들은 카르납(Carnap), 헴펠(C. G. Hempel), 오펜하임(Oppenheim) 등의 숫자를 통한 확률론적-정밀과학적 작업을 거짓말쟁이들의 진리날조행위라고 본다. 둘째, 현실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상응하는지도 의문스럽다. 20세기 후반기에는 프랙탈(fractal) 기하학이 나타났다.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더 확대할수록 유클리드 기하학적 현상이 점점 더 직선으로 나타나는 반면, 프랙탈 기하학적 현상은 점점 더 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생활세계를 보면, 풀잎?나뭇잎?산?강?구름, 바람, 혈액순환?호흡?학교수업?부부생활?사회적 교제 등 거의 대부분이 현상들이 원적(=관계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법이 대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역이어서는 안된다’는 고래의 정리를 따르는 한,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는 경제성장?지평선 등 현실의 작은 일부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언어의 모사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언어의 거울이론도 의문스럽다(Vgl.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넷째, 숫자가 ‘분석적’인지도 의문스럽다. 칸트는 숫자는 종합적(synthetic)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과 5개란 숫자는 벌레먹은 사과?빨간 사과?까치가 쪼아먹은 사과 등의 구체적 사과들의 속성을 말해주지는 아니한다. 다섯째, 이 네 가지 문제가 없는 경우에조차도 소위 ‘흄의 귀납법의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영원한 숙제로 남는다. 여기서 구성주의자들은 20세기초 베를린학파의 대표자였던 라이헨바흐(Hans Reichenbach, 1891~1953)의 아이디어에 유래하는 결정이론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흄의 귀납법의 문제를 실용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서는 ‘진리상응이론’을 포기하고 생존능력(viability)개념으로 대체하는데, 현재 이는 흄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석적-현실주의적 과학관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1931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Godel’s incompleteness theorems)에 의해 위기에 빠졌다(소위 기초과학의 위기). 이 기초과학의 위기는 구성주의적 수학과 구성주의적 해석학을 통해 미봉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는 자연과학의 여러 분과들에서 소위 ‘자기조직들’(self-organizations)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자기조직시스템 속의 ‘자기준거’(self-reference)와 부분순환의 ‘선순환적 구조’가 발견됨에 따라 과학개념은 ‘혁명적 전환’(revolutionary turn)을 경험하게 되고 ‘포스트-모던’이란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컴퓨터, 핸드폰 등 새로운 현대적 전자기기들도 존재하게 되었다. ‘저자의 머리말과 서론’에서 간파할 수 있듯, 최근에는 영미권에서도 구성주의적 과학관이 이제 새롭게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인 해석학은 오늘날 자연과학에서도 주요한 방법론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소위 엄청난 전문지식을 전제하는 고도로 복잡한 발전단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도 해석학 입문서들의 번역활동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이상에서 과학의 확실성(Sicherheit, certainty)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분석적 과학관과 형식과학들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실은 결국 구성주의 과학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최종적 진리(final truth)라고는 주장할 수 없으며, 그 한계를 의식하면서 형식과학(수학, 논리학, 통계학)의 내용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구성주의적 사고도 (우리가 인간의 종국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한) 결국 회의주의철학(skeptic Philosophy)에 기초할 수 있을 뿐이다. 여하튼 형식이 내용을 압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권 제4부 제2장 ‘사회과학들에서의 귀납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주의적 과학관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현상학적 현실을 취급하는 인문사회과학들에서는 일반적?법칙적 진술의 추구는 무의미하며, ‘부분-부분-(비율)진술만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도 보편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현상학적 현실의 분석적?현실주의적 과학관에 따른 직선적?양단적 포착시도는 미묘한 문제들을 빠뜨리기 마련이다.